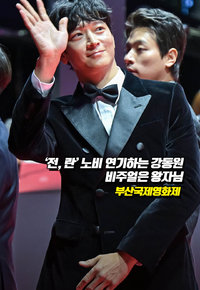* 이 기사에는 영화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체벌 행위에 ‘전면 금지’라는 딱지가 붙은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시작은 이보다 조금 앞서지만, 배우 김혜자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의 제목이 유행처럼 번진 후부터 교편(敎鞭)은 환영받지 못했다. 당시 체벌에 대한 찬반 의견은 대입 논술 예상 주제로 빠지지 않았다. 일본의 유토리(ゆとり : 여유를 뜻하는 일본어) 세대 격인 우리나라의 이해찬 세대, 그 한복판에서 자란 아이들은 점점 덜 맞고 덜 공부하는 길을 걸었다.
이 같은 상황과 교권의 추락이 반드시 줄이음될 수는 없지만,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처럼 매를 들지 못하는 교사의 권위는 이 이후로 꾸준히 떨어졌다. 어쩌면 까마귀가 배를 건드린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 수밖에 없다. 단계적으로 진행됐다고는 하나 길고 긴 체벌의 역사를 고작 몇 년 새 180도 바꾸기는 무리였다. 학교에서 회초리를 잡지 못하게 된 지금도 체벌에 대한 효용성과 당위성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영화 ‘4등’의 표피는 과거 올림픽 유망주였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수영 코치와 초등부 수영선수의 갈등으로 덮여 있다. 그러나 체벌로 촉발된 이 갈등의 내면은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하다. 단순히 ‘이 세상에 맞을 짓이란 없습니다’라는 하나마나한 소리로 눙치기에 ‘4등’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깊고도 넓다.
어떤 이의 꿈으로서 사는 삶은 괴롭다. 정확히 메달권에서 벗어난 4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백점 만점의 시험에서 99점 짜리 시험지가 휴지 조각 취급을 받는 것과 같다. 실력은 있지만 노력은 하지 않는 광수(정가람 분)는 태릉의 골칫거리다. 조금만 더 채찍질을 하면 신나게 달릴 듯한, 적어도 4등은 면할 것 같은 광수에게 박감독(유재명 분)은 끝내 매질을 한다. “나중에 나한테 감사할 날이 꼭 올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내려꽂히는 마대를 붙잡아 던지고, 광수는 선수촌을 떠난다.

시간은 16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누군가의 희망이자 소원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매번 4등을 하는 바람에 엄마 정애(이항나 분)의 독기 어린 한숨을 다 받아내는 준호(유재상 분)다. 관심도 없는 1등의 그림자가 준호를 계속 따라다니니, 마지막 턴을 돌아 벽에 터치를 하자마자 숨을 고르는 대신 고개를 돌려 전광판의 성적을 애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앞에 코치로 나타난 광수(박해준 분)는 박감독으로부터 유산처럼 되물림받은 교육 방식을 그대로 준호에게 쓴다. 진저리가 쳐질 만큼 싫어하던 윽박과 매질로 준호를 다스린다. 이제 어느 누구도 광수를 자신의 꿈으로 삼지 않는 세상에서, 그는 자신을 더 다그쳐주지 않은 박감독을 탓하고 싶었을 터다. 정애 역시 부러지지도 않는 플라스틱 걸레 자루로 두들겨 맞아 피멍이 든 아들 준호의 몸을 보고도 이를 묵과한다. “준호가 맞는 것보다 4등하는 게 더 무섭다”는 정애였으니, 그럴 법도 했다.
엄마도, 코치도 이게 옳다 말하니 준호 역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 수영이 좋고, 풀 안으로 스며드는 빛을 만지는 것이 좋았을 뿐인 준호는 멍을 문신처럼 온몸에 새긴 채로 끝내 2등을 따낸다. 엄마의 말대로 ‘상처를 메달로 가린’ 준호는 정신을 안 차려서 맞았다고 말하지만, 아빠 영훈(최무성 분)의 생각은 달랐다. 16년 전 체벌을 당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광수에게 “맞을 짓을 했으니 맞은 것 아니냐”던 그는 아들에게 “때리지도 맞지도 않고 1등을 해야 진짜”라고 가르친다.

이처럼 준호의 혼란은 물에서도, 뭍에서도 이어진다. 그 옛날 광수가 그랬듯, 아이에게 이 상황을 피하는 방법이라곤 혼탁해진 물에서 나오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수영을 하겠노라던 자신의 생애 첫 선택에 다시 한 번 믿음을 싣는다. 그는 온전히 자신만의 의지로 다시 광수를 막아 세우고 코칭을 부탁한다. 한 번도 진짜 1등을 하고 싶은 적은 없었지만 수영을 하고 싶다는 준호에게, 광수는 자신이 쓰던 수경을 건네고 돌아선다.
확실히 준호는 보통 아이는 아니다. 어린이의 자유 의지를 거의 인정해 주지 않는 이 나라에서 성적 욕심도 없는 준호가 그저 수영이라는 행위를 욕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는 과연 어른에게서도 보기 힘든 용기가 수반된다. 게다가 준호에게는 잠재된 능력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준호의 이야기가 범인(凡人)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던 까닭은 모두가 삶 속을 혼란스럽게 흐르는 선택과 포기의 순간,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오롯이 나만의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이 잔혹한 성장담의 끝은 통쾌하기까지 하다. 준호는 스스로 수영대회에 참가하고, 스스로 준비에 나선다. 그의 곁에는 엄마도, 광수도 없다. 대회날 아침, 준호는 광수로부터 받은 수경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대로 책상 위에 두고 나온다. 박감독이 광수에게, 광수가 준호에게 물려주려 했던 매질의 역사를 열두살 어린 아이가 끊어낸 찰나였다. 마치 다르덴 형제의 ‘자전거 탄 소년’의 시릴(토마 도레 분)이 넘어진 자전거를 일으켜 먼지를 툴툴 털고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나가던 그 순간처럼 짜릿한 끝, 그리고 시작이었다.
정해진 영법도, 코스도 없이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레인 위를 유영하며 쪼글쪼글해진 손으로 빛을 만지는 것으로 물을 즐기던 준호가 혼자 참가한 대회에서는 또렷이 뻗은 레인을 직시한다. 아름다운 춤처럼 물살을 가르던 준호는 잠시 숨을 쉬러 수면 위로 고개를 빼지만 물을 벗어나도 물 속과 같다. 다섯 살 평생을 갇혀 살던 ‘룸’을 나와도 또 다른 룸 같은 세상을 만난 잭(제이콥 트렘블레이 분)이 과감히 정든 룸과 작별을 고했듯, 그는 뭍으로 나와서도 전광판을 돌아보지 않는다. 맞지 않고도, 1등을 욕심내지 않고도 물을 즐길 수 있게 된 준호의 담담함이 깊은 울림을 남긴 이유다. 그는 메달로 상처를 가리는 대신 스스로 내상을 치유했다.
‘4등’은 이처럼 체벌이라는 하나의 소재를 두고 얽힌 극 중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 목적의 체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한 해묵은 문제부터 단순히 성과로 상처를 덮는 일의 공허함, 그리고 인간이 자유 의지를 발현하며 성장해 가는 과정까지. 이 완벽히 직조된 이야기에 영민하게 뚫린 틈을 메우는 것은 관객의 몫이다.
유토리 세대도, 이해찬 세대도 그 시작은 준호처럼 단단한 인간을 키워내기 위한 것이었을 터다. 1/1000초까지 나를 재는 세상에서 보다 여유롭고 인간다운 삶, 배우는 사람을 위한 교육은 어려울 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해야 할 일은 아니다. /bestsurplus@osen.co.kr
[사진] ‘4등’ 포스터, 스틸컷